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음악 잘 아는 소위 '음잘알' 들이 꽤 있다. 나랑은 거리가 먼 얘기다. 난 입이 짧다. 편식을 열심히 한다. 음악도 그렇다. 좋아하는 노래만 주구장창 듣고 새로운 노래를 들으려는 시도를 별로 하지 않는다. 그래서 가끔 꽂히는 노래가 있으면 며칠 동안 껌에 있는 단물 빨아먹듯이 신나게 들은 다음 몇 주를 잊어버린다.
어쨌든 뭔가 아무 얘기나 써보고 싶었다. 트위터에 음악 계정을 따로 만들어봤지만 영 쓰질 않아서, 그냥 블로그에 쓰기로 했다. 군대에 가기 전까지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을 다 풀어낼 수도,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. 그러나 글을 뭐라도 써야겠다 싶어서 그냥 쓰기로 했다. 대충 주제는, '추천한다 이 노래' 정도로 해보겠다. 부제를 못 정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달아야지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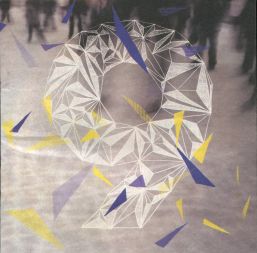
<석별의 춤> (2009)
[9와 숫자들] by 9와 숫자들
우린 같은 공기로 숨을 쉬지만
다른 언어로 얘기하고
같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도
서로 다른 꿈을 꾸지
<석별의 춤>
9와 숫자들의 노래를 무척 좋아한다. 주워들은 얘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. 이 앨범에서는 <석별의 춤> <그리움의 숲> <말해주세요> <오렌지 카운티> 를 좋아한다.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<석별의 춤> 인데, 좋은 기분일 때든 우울한 기분일 때든 변함없이 귀에 잘 들어오는 곡이다. 유감스럽게도 그 이후 9와 숫자들이 낸 (내 기준에서) 좋은 노래는 <숨바꼭질> 과 <깍쟁이> 둘 뿐이다...
석별, 사전을 찾아보면 애틋하게 이별한다는 뜻이다.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터라, <석별의 춤> 역시 들으면서 여러 번 곱씹었다. '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느끼는' 것이 1절의 내용이고, '다른 것을 보면서도 같게 느끼는' 것이 2절의 내용이다. 누군가 1:1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보면 항상 다가오는 감정들이 아닐까.
(아, 글이 점차 구려지는 걸 스스로 감지하고 있지만 어쩔 도리가 없으니 일단 계속 써본다.)
재밌는 것은 가사의 중요한 부분은 모두 과거형이란 것이다. '차가운 손을 잡아주시던 그대' '막강한 힘에 함께 맞서던 우리' ... '잡아주시는' 도 아니고, '맞서는' 도 아니다. 과거엔 그랬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걸까? 아니면 예전에 그래왔듯이 지금도 함께 하자는 걸까? 제목에 '석별' 이 들어가있으니까 아무래도 전자 같지만.
노래 가사를 가지고 머리를 굴리니까 갑자기 피곤해진다. 짧게라도 글 하나를 쓰는 쪽이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, 이만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엔 좀더 길게 끄적끄적해보겠다.
'일상과 놀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아주 평범한 음악 이야기 (3) (0) | 2015.09.20 |
|---|---|
| 아주 평범한 음악 이야기 (2) (0) | 2015.09.18 |
| 안녕, 핑크문 (0) | 2015.06.01 |
| 위로의 방법 두 가지, <불꽃놀이> 와 <그대에게> (0) | 2015.05.13 |
| 한희정 소극장 콘서트 '타인의 겨울' (With 푸른새벽) (0) | 2014.01.12 |




